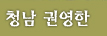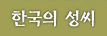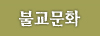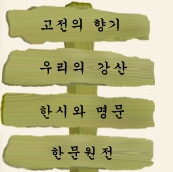柴𨵿嶺(柴𨵿령) 王漁洋(왕어양)
|
早發陳倉道(조발진창도) 馬蹄亂雲霧(마제란운무)
行行到柴𨵿(行行到柴𨵿) 雲低雨傾注(운저우경주)
衺徑中槎牙(사경중사아) 幽篁四森布(유황사삼포)
大石立當𨵿(大石立當𨵿) 𫝑如猛虎踞(𫝑여맹호거)
世無飛将軍(세무비장군) 磨牙爾何怒(마아이하노)
蛟龍喜昵近(교룡희닐근) 氣奪生憂懼(기탈생우구)
怪鳥時一啼(괴조시일제) 聞聲不知處(문성불지처)
黒江逺𣻳洞(흑강원경동) 萬瀑齊奔赴(만폭제분부)
頗聞紫柏山(파문자백산) 仙靈𠩄逰寓(仙靈𠩄逰우)
石髓儻一逢(석수당일봉) 白日生毛羽(백일생모우)
誰使野鶴姿(수사야학자) 氋氃墮籠笯(몽동타롱노)
真宰不可問(진재불가문) 更向蒼茫去(경향창망거)
|
<해>
진창도에서 아침 일찍 길을 떠나니,
말발굽은 안개와 구름을 뒤섞으며 달린다.
달리고 달려 마침내 채관령에 이르자,
구름은 낮게 깔리고, 빗줄기는 쏟아진다.
험한 길엔 삐죽한 돌길이 얽히고,
깊은 대나무 숲이 사방을 빽빽이 감싸며 서 있다.
커다란 바위가 고갯길을 막고,
모양은 마치 맹호가 웅크리고 앉은 듯하다.
세상엔 더는 비장군(飛將軍)이 없으니,
네가 이리도 이를 갈며 성내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교룡이 기뻐하며 가까이 다가오고,
그 기세는 사람의 혼을 빼앗아 두렵게 만든다.
괴이한 새가 이따금 울고,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나는지 알 수가 없다.
검은 강이 멀리 동굴 속으로 흐르고,
만 갈래의 폭포가 일제히 달려간다.
듣건대, 이곳 근처에 자백산(紫柏山)이 있다는데,
신령들이 거처하며 노닐던 곳이라 한다.
만약 이곳에서 신비로운 돌髓을 만나면,
대낮에도 털과 날개가 돋아날지도 모른다.
누가 들새 같은 자태를 가진 이 학을
짙은 안개 속 우리 속에 떨어지게 했던가?
진정한 주재자(하늘의 뜻)는 물을 수 없으니,
나는 그저 다시 아득한 창망한 곳으로 나아갈 뿐이다.
평론 및 해설
1. 서사적 시작 – 고갯길의 긴 여정
시의 앞부분은 여행자의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말발굽 소리, 구름과 안개, 빗줄기, 돌길과 대나무 숲 등은 실제 경로의 험난함을 생생하게 그리면서도, 현실 세계에서 비현실의 세계로 넘어가는 경계로서 기능합니다. 마치 장자(莊子)의 경지처럼, 자연과 인간의 경계가 흐려지는 지점입니다.
2. 자연의 형상 – 맹호와 교룡
“맹호처럼 생긴 바위”, “교룡이 다가오고”, “괴이한 새가 운다”는 표현은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산중에서 느끼는 인간의 원초적 공포와 신비감을 압축한 이미지들입니다. 여기서 왕어양은 자연을 거대한 생명체처럼 그리고 있으며, 그 생명은 인간보다 더 오래되고 크며, 쉽게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3. 초월적 동경 – 자백산과 선령(仙靈)
중반부에서 언급되는 **자백산(紫柏山)**은 도가(道家) 전설에서 신선이 거처하던 장소로 알려진 곳입니다. 이 신비한 장소를 통해 시인은 무릇 자연은 단지 험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신령들이 숨쉬는 신비의 세계임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석수(石髓)"를 만나 "백일생모우(白日生毛羽)"한다는 말은, 현실을 초월한 존재로의 비상, 곧 신선이 되는 경지를 말합니다. 이는 장자의 "포영지사(胞映之士)" 같은 신선의 꿈과 겹칩니다.
4. 결말 – 물을 수 없는 ‘진재(真宰)’
“진재(眞宰)”는 ‘참된 주재자’, 곧 천명(天命) 혹은 절대적 자연의 이치를 뜻합니다. 인간은 그 뜻을 알 수 없고, 오직 자신만의 길을 걸어갈 뿐이라는 결론은, 장자, 노자, 불교적 사유가 만나는 지점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총평
이 시는 단순한 산행 묘사를 넘어서, 자연과 인간, 공포와 동경, 현실과 초월을 엮어내는 장대한 철학적 여정입니다. 시인이 도달한 채관령은 지리적 목적지가 아니라 정신적 경계이며, 그곳에서 마주한 자연은 인간을 압도하면서도 품어주는 거대한 ‘도(道)’의 현현입니다.
왕어양은 이 시에서 장자의 꿈, 도가의 초월, 그리고 유가적 정감을 모두 엮어내며, 청대 시가에서 보기 드문 깊이 있는 초월적 산문시를 완성하고 있습니다.
.JPG)
이 곳의 자료는 청남선생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