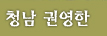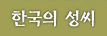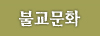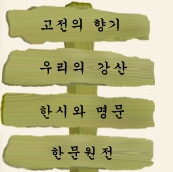閨怨(규원) 魚玄機(어현기)
|
蘼蕪盈手泣斜暉(미무영수읍사휘) 聞道鄰家夫壻歸(문도린가부서귀)
別日南鴻纔北去(별일남홍재북거) 今朝北雁又南飛(금조북안우남비)
春來秋去相思在(춘래추거상사재) 秋去春來信息稀(추거춘래신식희)
扃閉朱門人不到(경폐주문인불도) 砧聲何事透羅幃(침성하사투라위)
|
규방 속의 슬픔.
향초 손에 가득 들고 석양 속에 울고 있어요.
소문에 옆집 낭군은 먼 여행에서 돌아 왔다는데
이별 할 때 남으로 왔던 기러기 이제 북으로 날아 가고
오늘 아침 북쪽 기러기 또다시 남으로 날아왔네요.
봄이 오고 가을 가도 그대 사모하는 생각 변함이 없는데
가을 가고 봄이 와도 기다리는 당신 소식 전혀 없네.
문을 굳게 닫고 내 방안에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사는데
멀리서 나는 다듬이 소리 왜 내 휘장 속까지 들려오는가.
【註】
閨怨(규원) 규방의 슬픔.
蘼蕪(미무) 香草(향초)의 일종. 屈原(굴원)의 九歌(구가)에 「秋蘭(추란)과 蘼蕪(미무)」라는 구 절이 있고, 漢(한)의 한 古詩(고시) 내용에 「쫓겨난 전처가 산에 올라가 蘼蕪(미무) 라는 香草(향초)를 캐서 돌아오는 길에 전 남편을 만났다. 무릎을 꿇고 “새 처는 어 떻던가요?”하고 꼬집었더니 남편이 답하기를 “글쎄 새 마누라가 좋긴 하지만 역시 네가 더 미인이었다. 얼굴 생김은 그렇다 쳐도 손놀림은 너만 못하더라. 후처가 와 서 네가 쫓겨났지만 후처는 명주를 잘 짜며 사치스러운 여자이고, 너는 무명을 잘 짜는 일 잘하는 여자 이었더구나. 명주는 하루에 한 필, 무명은 하루에 다섯 필을 더 짜던데, 명주와 무명 짜는 솜씨를 비교 해봐도 역시 네가 더 일을 잘하는 좋은 여자였단다.”라고 대답하였다 한다. 魚玄機(어현기)는 자신을 그 쫓겨난 여자에 비 유하고, 그 여자는 그래도 전 남편을 만날 수 있었지만 자신은 만날 수도 없으니 더 욱 비참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斜暉(사휘) 석양에 비치는 햇볕.
聞道(문도) 소문.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하면.
夫壻(부서) 남편.
南鴻(남홍) 鴻(홍)은 철새. 기러기 큰 것. 南鴻(남홍)은 남쪽도 추워지자 더욱 남쪽으로 온 기 러기.
雁帛(안백), 雁書(안서)라는 말도 있는데, 북방 匈奴(흉노)에게 잡혀있었던 漢(한) 의 蘇武(소무)가, 자기는 잡혀 있고 또한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천에 써서 기러기 발에 묶어서 날려 보낸 결과, 漢(한) 궁전 마당에서 기러기를 쏘아 그 발에 묶인 편 지를 읽어보고 漢(한)은 匈奴(흉노)에게 蘇武(소무)의 引渡(인도)를 요구했다는 고 사에서, 雁(안)을 “소식”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다.
纔(재) 겨우. 바로 지금.
北去(북거) 남쪽 지역이 따뜻해지자 寒地(한지)에 사는 기러기가 북쪽으로 돌아갔다는 것. 따라 서 기러기가 돌아간 것은 그곳에 寒氣(한기)가 사라지고 따뜻한 봄이 왔다는 것을 뜻함.
相思(상사) 사모하는 생각.
信息(신식) 소식. 서신.
扃(경) 빗장.
朱門(주문) 귀족의 저택 문은 주로 붉은 색을 칠해서 장식함. 귀족 또는 부자라는 듯으로 사용 함.
砧(침) 다듬질.
羅幃(라위) 엷은 비단으로 만든 휘장.
【解說】
古詩(고시) 중에 「산에 올라 蘼蕪(미무)를 캐고 산을 내려와 故夫(고부)를 만나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가 있다. 蘼蕪(미무)는 일종의 香草(향초)이고 故夫(고부)란 자기를 버린 전남편이다. - 지금 나는 그 시에 나오는 여자같이 남편 李億(이억)에게 버림을 받은 몸이다. 먼 옛날 시에 나오는 여자같이 산에 올라가 향초를 캐는 일도 있다. 그러나 그 시 속에 여자 같이 산 아래에서 전 남편을 만날 수는 없었다. 오직 나 홀로 산 속에서 향초를 손에 가득 들고 지는 해를 등에 업고 남편 생각으로 울 뿐이다. 그것은 옛 시 속에 여자보다 더 비참하고 가련하지 않을까?
그러나 그러한 나의 슬픔과는 대조적으로 옆집에서는 오랜 여행을 마치고 남편이 돌아 왔다는 소문이 돈다. 옆집 여자 얼마나 기쁨으로 들떠 있을까. 남의 일이지만 질투가 난다.
내가 남편과 헤어진 것은 봄이었다. 추운 겨울 동안 남쪽으로 왔던 기러기가 지금 북으로 돌아가는 때이다.
그로부터 반년. 오늘 아침 그 기러기가 가을도 다 지나가려 하니 다시 남쪽으로 돌아온 것을 보았다. 봄부터 가을까지 나는 남편의 일을 잊지 않고 늘 생각하고 살아왔다. 곧 가을이 다가고 봄이 오겠지만 남편으로부터의 소식은 있을 것 같지도 않다. 예부터 기러기는 사람의 소식을 전하는 새라고 일컬어지는데, 내 남편의 소식을 갖고 오지 않는 기러기는 밉기만 하다.
나는 문을 닫아걸고 오직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옆집에는 남편이 돌아왔다는데 우리 집에는 언제까지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는다. 다만 멀리서 남편의 옷을 만드느라 밤을 지새워 다듬이질하는 통탕 통탕 다듬이 소리가 “남편 남편”이라는 소리 같이 잠을 이룰 수 없는 내 깊은 침실 속 까지 들려온다.
아아!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될까?
옆집에 부인 오랜만에 남편 품에 안겨 얼마나 달아 있을까. 거기에 비해 나는 잠 오지 않는 긴 가을밤을 싸늘한 침상위에 누워 돌아오지 않는 남편 그리워 울고 있다. 왜 한 번 더 그 사람은 내 품으로 돌아와 주지 않는 걸까?
.JPG)
이 곳의 자료는 청남선생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