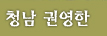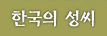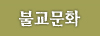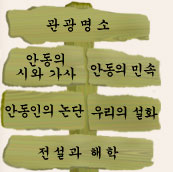分守東都㝢居履道叨承川尹劉侍郞大夫恩地上四十韻
(분수동도우거리도도승천윤유시랑대부은지상사십운) 杜牧(두목)
|
命世須人瑞(명세수인서) 匡君在岳靈(광군재악령)
氣和薰北陸(기화훈북육) 襟曠納東溟(금광납동명)
賦妙排鸚鵡(부묘배앵무) 詩能繼鶺鴒(시능계척령)
蒲親香顔色(포친향안색) 蘭動粉圍馨(난동분위형)
周孔傅文敎(주공부문교) 蕭曹授武經(소조수무경)
家僮諳禁掖(가동암금액) 廐馬識金鈴(구마식금령)
性與姦邪背(성여간사배) 心因啓沃冥(심인계옥명)
進賢光日月(진현광일월) 誅惡助雷霆(주악조뢰정)
閶闔開時召(창합개시소) 簫韶秦處聽(소소진처청)
水精懸御幄(수정현어악) 雲母展宮屛(운모전궁병)
捧詔巡汧隴(봉조순견롱) 飛書護井陘(비서호정형)
先聲威虎兕(선성위호시) 餘力活蟭螟(여력활초명)
榮重秦軍箭(영중진군전) 功高漢將銘(공고한장명)
戈鋌廻紫塞(과정회자색) 干戚散彤庭(간척산동정)
順美皇恩洽(순미황은흡) 扶顚國步寧(부전국보녕)
禹謨推掌誥(우모추장고) 湯網屬司刑(탕망속사형)
穉榻蓬萊掩(치탑봉래엄) 膺舟鞏洛停(응주공락정)
馬羣先去害(마군선거해) 民籍更添丁(민적갱첨정)
猾吏門長塞(활리문장색) 豪家戶不扃(호가호불경)
四知臺上鏡(사지대상경) 三惑井中甁(삼혹정중병)
雅韻憑開匣(아운빙개갑) 雄鋩待發硎(웅망대발형)
火中膠綠樹(화중교록수) 泉下劚靑萍(천하촉청평)
五嶽期雙節(오악기쌍절) 三台空一星(삼태공일성)
鳳池方注意(봉지방주의) 麟閣會圖形(인각회도형)
寒暑逾流電(한서유류전) 光陰甚建瓴(광음심건령)
散曹分已白(산조분이백) 崇直眼由靑(숭직안유청)
賜第成官舍(사제성관사) 傭居起客亭(용거기객정)
松筠侵巷陌(송균침항맥) 禾忝接郊坰(화첨접교경)
宿雨回爲沼(숙우회위소) 春沙淀作汀(춘사정작정)
魚罾樓翡翠(어증루비취) 蛛網掛蜻蜓(주망괘청정)
遲曉河初轉(지효하초전) 傷秋露已零(상추로이령)
夢餘鐘杏杏(몽여종행행) 吟罷燭熒熒(음파촉형형)
字小書難寫(자소서난사) 桮遲酒易醒(배지주역성)
久貧警早鴈(구빈경조안) 多病放殘螢(다병방잔형)
雪勁孤根竹(설경고근죽) 風彫數莢蓂(풍조수협명)
囀喉空婀娜(전후공아나) 垂手自娉婷(수수자빙정)
脛細摧新履(경세최신이) 腰虬減舊鞓(요규감구정)
海邊慵逐臭(해변용축취) 塵外怯呑腥(진외겁탄성)
隱豹窺重巘(은표규중헌) 潛虯避濁涇(잠규피탁경)
商歌如不顧(상가여불고) 歸棹越南霝(귀도월남령)
|
세상은 이름 높은 유능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데
인군을 지도하는 중임은 河嶽(하악)의 영을 받은 인물이 하네.
劉公(유공)을 살펴보니 氣(기)의 온화는 北陸(북육)의 엄함을 누그려 뜨리고
너그러운 아량은 동쪽 대해를 포용 하고도 남음이 있으며
문필에 능해서 賦(부)는 禰衡(녜형)의 鸚鵡賦(앵무부)를 능가
시는 小雅(소아)의 鶺鴒(척령) 후계라고 할 만큼 능해.
처음 보직은 補闕(보궐)이며 향기로운 안색으로
蘭(난)의 기풍을 상상케 하는 분위기로 근무했으며
文治(문치)는 주공 공자를 모범으로 삼았고
兵備(병비)는 蕭何(소하)와 曹參(조참)의 병서를 참고 하니
공의 감화로 아래 종까지 禁裏(금리)의 일들에 밝아서
말 머리에 다는 금방울에도 격조를 느끼는 감이 있었네.
공의 성품은 간사한 무리와는 정 반대로
마음은 항상 지도하는 인군과 冥合(명합)
賢者(현자)를 아침에 권해 성덕에 빛을 더했고
간악함을 주청해서 인군의 위엄을 도왔으니
공의 진언이 필요할 땐 궁문 열어 초빙하고
궁중의 秘樂(비악) 연주 될 땐 항상 拜聽(배청)을 허가
수정이 걸려 있는 옥좌의 휘장 가
雲母(운모)로 장식한 어전의 미닫이 문 옆
항상 가까이서 모시고 봉사하는 신분.
그러나 대사가 있으면 飛書(비서)를 보내 防危(방위)를 지휘하니
공의 명성만 듣고서도 외적은 겁먹어 진정되고
餘力(여력)으로 변경 백성 생활을 안정시키네.
군사에 능한 秦兵(진병)의 화살보다 영예는 무겁고
한 나라 때 장군 銘(명) 보다 공적이 찬탄되었는데
戈鋌(간정)은 만리장성지방을 위압하고
干戚(간척)의 춤은 宮廷(궁정)에서 펼쳐지네.
미덕 따라 성은은 넓게 서민까지 펼쳐지고
위험을 방지해서 국운도 안정되니 공의 공로 크도다.
공운 중서성에서 太禹謨(태우모)의 전형으로 국문을 다루고
刑部(형부)로 옮긴 뒤 그 법의 중책을 맡게 되었네.
그래도 현자를 맞이 할 榻(탑)은 蓬萊宮(봉래궁)에 두었고
高人(고인)과 놀 배는 鞏洛(공락) 땅에 마련해두었네.
伯樂(백락)이 말을 버리듯 해로운자 제거하고
盧仝(로동)이 아들에게 장정이라 부치듯 民籍(민적)에 청년 이름을 첨가하니
교활한 관리는 사람 앞에 못나오게 되고
부잣집도 문단속하지 않아도 안심하고 살수 있게 되었으며
四知(사지)의 고사는 秦宮(진궁) 대상에 있던 거울과 같이 곡직을 가르고
세상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우물 같은 三惑(삼혹)을 경계했네.
풍류의 韻律(운률)은 작품을 모은 상자를 열면 알 수 있고
사건에 대처하는 예봉은 새로 간 칼날같이 예리하며
불속에서 푸른 나무에 아교를 칠하고
샘물 밑에서 靑萍(청평)의 명도를 꺼낸다고나 비유 할까.
五嶽(오악)은 칙사의 雙節(쌍절)을 세운 공의 내도를 기다리고
묘당의 三台(삼대)는 공을 위해 한 자리를 비워 두었다네.
중서성은 공을 맞이하고자 마음 쓰고
麒麟閣(기린각)에도 곧 공의 초상화가 올라가리라.
돌이켜보니 한서의 변천은 전광같이 빨라
세월도 물 같이 흘러가 감회가 새로운데
나는 東都(동도) 分司(분사)라는 신분으로 만족하고 있으나
高位(고위)에 있는 공이 주목하니 감사하는 마음 간절하네.
옛날 선조로부터 받은 집은 관사가 되었고
남의 집을 빌려 기거하고 있는 형편
솔과 대나무가 자라나 통하는 길도 좁아지고
교외이므로 벼와 기장 밭이 이어져
비가 오래 내리면 사방이 물바다가 되고
봄에는 모래사장이 물가가 되어버리네.
어망을 치면 물총새가 와서 살고
거미가 줄을 쳐서 잠자리가 거미줄에 거리며
아침이 늦어지는 계절에는 강 흐름에 변화가 생기는 듯
가을의 쓸쓸함 느낄 때는 이미 서리가 내리네.
꿈꾸는 듯 세월 지나는 사이 어디선가 들려오는 종소리
노래라도 부르다가 끝이 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밝게 켠 등불
글씨라도 써 볼까 해도 글자 작아 어렵고
술잔 기울려도 쉬 취하지도 않네.
오랜 가난으로 기러기 날아 오면 추워질까 두렵고
병 많은 신세 마치 계절에 늦은 개똥벌레 불빛 같이 가냘프고
외롭게 선 대나무 눈에 쉽게 넘어지지 않는 광경 있는가하면
예로부터 이름 높은 莢蓂(협명)도 몇 포기 바람에 시드네.
목소리내면 말소리 젊다하고
손 내려 인사하면 맵시 좋다하나 다 소용없는 일.
무릎이 가늘어서일까 새신을 신어도 곧 망가지고
허리는 쇠약해져 옛날 혁대는 맞지 않아
만일 해변에 산다면 냄새나는 것에 익숙해질 것이고
세상 떠나 살려 해도 기름기 있는 것을 삼킬 염려가 있네.
털을 소중히 하는 표범은 비와 서리 피해 깊은 남산에 숨는다 하고
세상에서 몸을 숨기는 아기용은 탁한 물에는 살지 않는다 하는데
나는 이 哀調(애조)의 노래를 들어주는 이가 없다면
배에 돛을 달고 남해를 넘어 朱方(주방)에 마련해 준 주거로 은퇴할거네.
【註】
命世(명세)....... 세상에 이름이 높음.
人瑞(인서)....... 덕이 높은 선비.
岳靈(악령)....... 산의 신령.
北陸(북육)....... 二十八宿(이십팔숙) 가운데 虛(허) 星座(성좌).
東溟(동명)....... 동방의 大海(대해).
鸚鵡(앵무)........ 後漢(후한)의 禰衡(녜형)의 鸚鵡賦(앵무부). 文選(문선) 13권에 所 載(소재).
鶺鴒(척령)........ 詩經(시경) 小雅(소아)에 나오는 말. 형제가 急難(급난)을 만나 서 로 도와간다는 의미.
粉圍(분위)........ 尙書省(상서성).
周孔(주공)........ 周公(주공)과 孔子(공자).
禁掖(금액)........ 禁裏(금리). 皇居(황거).
啓沃(계옥)........ 主上(주상)을 지도하다.
閶闔(창합)........ 天門(천문). 皇城(황성)의 문.
簫韶(소소)........ 舜帝(순제)의 樂(악).
汧隴(견롱)........ 지방의 이름. 지금의 陜西省(협서성) 隴縣(롱현)의 남쪽 지방.
井陘(정형)........ 漢代(한대)에 창건한 縣(현)의 이름.
先聲(선성)........ 실력을 행사하기도 전에 명성으로 이미 상대를 굴복시키고 있다.
虎兕(호시)........ 蠻族(만족).
蟭螟(초명)........ 작음 벌레. 미천한 사람을 비유.
戈綎(과정)........ 武器(무기).
紫塞(자색)........ 萬里長城(만리장성).
干戚(간척)........ 방패.
彤庭(동정)........ 궁중의 뜰. 宮廷(궁정).
禹謨(우모)........ 고대의 賢主(현주) 禹(우)의 計策(계책).
掌誥(장고)........ 책명을 관장하다.
穉榻(치탑)........ 고귀한 분을 위해 특별히 의자를 마련해 둠.
洛停(락정)........ 周(주)의 畿內(기내) 지방과 洛邑(낙읍).
馬羣(마군)........ 좋은 말만 선발하고 나머지는 버림.
添丁(첨정)........ 자식을 낳아 나라를 위한 일꾼을 하나더 보탬.
四知(사지)........ 後漢書(후한서) 楊震(양진)전에 「진이 東萊(동래) 태수가 되어 昌邑 (창읍)을 지날 때 진의 추천으로 창업의 令(영)이 된 王密(왕밀)이 배알하고 밤에 금 열 근을 뇌물로 주려하니 진이 말하기를 “나는 그 대를 아는데 그대는 나를 모르는가?”하며 거절하니 왕밀은 “밤이라서 아무도 모릅니다.”라 했다. 그러나 양진은 “하늘이 알고 신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어찌 아는 자가 없다하나.”하였다. 그리하여 양진은 부끄러워 관직을 물러났다고 한다.
三惑(삼혹)........ 楊震(양진)의 아들 楊秉(양병)이 「내게 三不惑(삼불혹)이 있는데 酒 色財(주색재)이다.」 라고 했다.
井中甁(정중병)... 주역에 있는 말로, 우물물을 겨우 퍼 올렸는데 두레박이 뒤집혀 지 는 것은 흉하다는 뜻으로 사람의 수양이 아직 미완일 때 탈선해서 지금까지 닦은 모든 일이 허사가 되어 버린 다는 뜻.
靑萍(청평)....... 名劍(명검)의 이름.
三台(삼태)....... 별의 이름으로 紫心星(자심성)을 중심으로 하는 上臺(상대) 中臺(중 대) 下臺(하대)의 세 별로, 太尉(태위) 司徒(사도) 司空(사공)을 이 별로 자주 비유 한다.
鳳池(봉지)........ 鳳皇池(봉황지). 禁苑(금원) 속 中書省(중서성)이 있는 곳에 있음.
麟閣(인각)........ 麒麟閣(기린각)
建瓴(건령)........ 강물이 마치 기와 위를 흘러내리듯이 흐르는 것.
殘螢(잔형)........ 빛이 흐려진 반딧불.
隱豹(은표)........ 남산에 사는 玄豹(현표)는 털빛을 소중히 여겨 안개나 비가 올 때는 먹이를 먹지 않고 산에 숨어서 산다고 함. 隱遁(은둔)에 비유.
.jpg)
이 곳의 자료는 청남선생님의 열정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자료입니다.
자료를 사용하실 때에는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